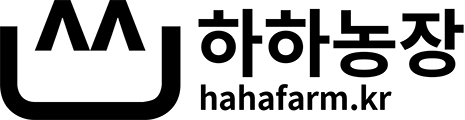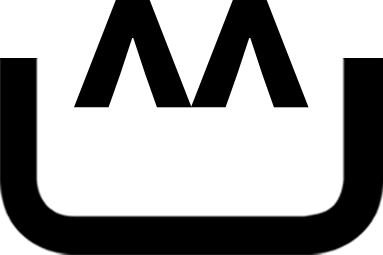최근 환경부에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내놓았다. 악취하면 빠지지 않는 돈사 역시도 시책의 주요대상으로 꼽혔다. 당연한 일이다. 그 냄새를 단 한번이라도 맡아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일 것이며, 돈사 이웃들은 환호성이라도 지를 것 같다.
그런데 시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냥 환호하기가 힘들다. 냄새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아닌 그냥 냄새를 막아버리는 인상이다. 친환경을 제외한 모든 신규돈사는 2020년부터 의무적으로 밀폐화설계를 해야하고, 기존 돈사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밀폐화해야 한다. 돼지들이 살아있다는 걸 잊어버린 건 아닐까?
돼지는 개, 소와 더불어 수천년 이상을 집에서 함께 지낸 가축이다. 사실, 일상에서 흔히 쓰는 ‘家’자는 돼지우리 그림이다. 집을 뜻하는 갓머리(宀)에 돼지그림이 변형된 돼지 시(豕)자가 합쳐진 상형문자다. 적어도 3천년 전에 만들어진 이 글자는 돼지우리를 ‘집’으로 표현했다. 이 글자가 만들어지고 쓰이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집에 돼지가 사는 모습이 아주 일반적이었던 셈이다.
늘 같았던 것은 아니지만 불과 4~50년 전까지도 ‘家’자 처럼 집집마다 돼지를 한 두마리씩 키웠다. 판재나 통나무를 사용해 돼지우리를 지었는데 바람도 잘 통하고, 햇볕도 제법 들어왔으며, 당연히 흙바닥으로 돼 있었다. 돼지우리는 지금처럼 혐오의 대상은 아니었다.
돼지들에게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미강(현미를 백미로 만들 때 나오는 가루), 싸레기(쌀 찌끄레기) 등의 곡물부산물, 구정물(음식잔반), 들판에 널린 풀, (지역에 따라)사람의 똥 등을 주었다. 돼지들은 걱정없이 쉽게 먹이를 구했고 짧게나마 건강하게 살았다. 덕분에 사람들은 사냥을 하지 않고도 고기를 얻을 수 있었다.
수천년 동안 유지되었던 사육 개념은 1966년도에 대규모 축사가 생기며 변하기 시작했다. 규모는 100두정도로 지금으로 치면 소규모였다. 1980년에 10,000마리를 키우는 농장이 등장하면서 대규모 공장식 양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가가호호 있던 돼지우리와 대규모 양돈장은 모든면에서 달랐다. 대규모 양돈장은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분뇨처리를 위해 자연요소들을 대거 빼냈다.
돼지는 더위를 많이 타는 동물이다. 사람같은 땀샘이 없어 체온의 방출이 쉽지 않다. 그 때문에 진흙목욕으로 체온을 조절한다. 더울 때는 식욕이 없어져서 사료도 적게 먹고, 살이 덜 찐다. 겨울에는 사료를 많이 먹어 체온을 유지한다. 하지만 먹는 양 대비 살은 안찐다. 어미돼지들은 날씨에 영향을 더 받아 새끼돼지 임신 주기가 늘어난다. 여러모로 날씨는 대규모 사육에 있어서 방해요소다. 내리쬐는 햇빛을 막아 복사열을 차단하고, 벽을 세워 뜨겁거나 차가운 외기를 막는다. 대신 내부의 냉난방 시설을 통해 사계절 내내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폐쇄적으로 관리하는) 창이 없는 ‘무창돈사’의 방식이다.
태어나 태양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돼지들도 있다하니 하루하루가 절망일 것 같다. 햇빛은 필수 비타민인 비타민D의 생성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면역증가 등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낸다. 공룡들이 멸종한 이유가 운석의 직접적인 충격파가 아닌 햇빛이 몇 년간 가려진 것 때문이라고 하지 않는가. 불행히 비타민D 보충제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한다. 결코 태양을 흉내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방식에서 똥과 오줌을 치우는 일은 축사 내에서 가장 큰 일이다. 초기에는 각 돈방마다 사람이 들어가 삽으로 퍼 냈을 것이다. 인력으로 버거워질 정도의 규모가 되자 똥을 편하게 치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었다. 그 중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것이 ‘슬러리피트’ 돈사이다. 바닥은 ‘슬랏’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바닥에 구멍이 뚫려있다. 그 아래에 똥오줌을 섞어모으는 ‘슬러리피트’라는 장치를 둔다.
돈방의 똥오줌들은 물청소를 통해 슬러리피트에 모이게 되고, 물과 섞이게 된 똥오줌들은 주기적으로 펌프나 내장되어 있는 이송시설을 통해 분뇨처리시설로 옮긴다. 자료를 살펴보니 관리가 우수한 농장에서는 보름에서 한달, 게으른 농장에선 몇달동안도 똥오줌을 방치했다. 그 사이 유해가스가 돈사 내부를 채워 돼지는 물론 노동자의 건강도 해친다. 작년에 돈사에서 숨진 이주노동자들이 이 시설을 청소하다 변을 당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말하자면, 돼지들은 구멍 뚫린 똥통 위에 살고 있다.
수십만년 동안 코로 땅을 파서 밥을 먹고, 잠자리를 만들었는데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은 당연히 괴로울 것이다. 그것이 똥통이라면 더더욱… 돼지들은 개보다도 후각이 발달했다고 알려져 있다. 아마 그런 후각으로 밭에 있는 감자나 고구마 같은 구근식물들도 딱 먹기 좋을 때가 되어야 파내고 먹는 것 같다. 우리밭의 옥수수도 계속 잘 있다가 ‘내일 따면 딱 좋겠다’고 생각한 그날 맷돼지들이 먹고 가기도 했다. 그러나 대규모 양돈장의 돼지들은 발달된 코로 땅을 파지도, 먹이 탐색도 못한다.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악취를 맡는 것 뿐이다.
현대의 축산업은 대부분이 돼지들을 ‘생명’이 아닌 제품으로 여기고, 공장식으로 운영한다. 수익성, 효율화, 대량생산 등 기업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돼 있다. 이제는 정부마저도 돼지들을 공장으로 밀어 넣으려고 있다. 조금 남아있던 숨구멍마저도 막아버리라는 시책이라니.
사업자도 정부도 돼지의 건강은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 건강하지 않은 돼지가 사람에게 건강을 줄 수 없다. 생명에 필요한 자연요소들을 차단한 채 건강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통적인 사육개념을 지금에 요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돼지에게서 빼앗은 햇볕과 바람, 땅은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야 돼지도 사람도 건강하다는 걸 명심하자. ‘내가 먹는 것이 나’라고 한다. ‘나’는 똥통 위에 사는 병든 돼지가 될 것인가, 햇볕받고 흙에서 사는 건강한 돼지가 될 것인가.
2019년 1월 15일 한겨레 애니멀피플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