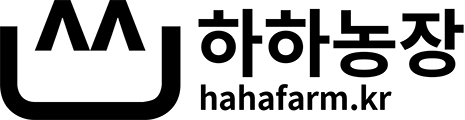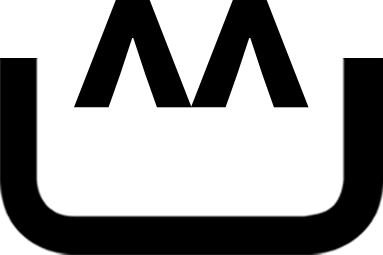처음 묵게된 호텔, 비싼 방값 알고보니 보증금 포함
대장금이 방영하던 때, 한국인에 대해 호의적인 분위기
처음보는 고층 탑, 비영탑.

전날의 아픔을 상기하며 이 도시에서는 좀 깨끗한 숙소에 머물러야겠다고 생각했다. 지도에는 그리 큰 도시라고 표시는 되어있지 않았지만 꽤나 번화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관광호텔정도로 보이는 호텔 주변을 맴돌았다.
사실, 너무 비싸면 어쩌나. 내 모습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초라한데 쫓겨나면 어쩌나 했다. 그러다가 어쨌든 한국인이다 생각하곤 들어갔다. 로비는 상당히 깨끗했다. 프론트에 이쁜 중국여성 둘 있었는데 추한 몰골이 여간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사전을 통해 힘들게 알아낸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거런 이티엔 뚜어샤오치엔?”(한사람 하루 얼마에요?)
“^%$^*$%$%#@^# 야징 !#$#@^@% 삼바이콰이치엔 ”
당황스런 표정을 지어보았다. 그래도 계속 중국어로 얘길했다. 외국인에게는 비싸게 받는다는 얘길 듣고 왔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것을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다. 가격만 물어보면 얼마라고 대답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 돈만 내면 거래 끝인 것. 자연스레 발음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던가! 그런데 대부분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중에 ‘삼바이 콰이치엔’ 이라는 말을 분석해보니 300원이라는 말이었다. 나는 어이가 없어
“꾸이, 꾸이”(비싸요, 비싸)
라고 했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다시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EDITORCONTENT%%amp;%^&^%@#!$ 야징 ^&^(&*^%%EDITORCONTENT%%amp;%^#$% 똥마”
어쩔 수 없이 한국인임을 밝혀야 했다.
“워스 한궈런, 워 팅뿌동 쭝원”(나 한국인이에요, 중국어 몰라요)
그랬더니 직원 둘이 폭소다. 눈치로 봐서는 ‘니가 무슨 한국인이냐’, ‘거지 몰골해가지고는’.. 그런 분위기였다.(사실, 대학 1학년 재학당시 중국어 교양수업 1년간 들었다. 그 때 주변 친구들을 놀라게 하던 나의 중국어 발음만은 그 때까지 남아있어 그런 것 같다)
그리곤 뜬금없이 ‘따창진’(대장금) 아느냐고 했지만 내가 대장금은 알아도 ‘따창진’은 몰라 ‘응?’했더니 종이에다 한자를 적었다. 한자를 적는다고 내가 알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아~’ 했더니, 한자로 통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나보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중국어로 얘길했던 핵심내용을 두글자로 표현했다. ‘押金’(야징) 돈을 눌러라? 어디에다? 아~ 호텔에다? 누르면 돈이 나오나? 사전을 찾으니 ‘보증금’이었다. 보증금 180원에 방값 120원 해서 300원이었던 것이다.
“아~~ 야징이 보증금이었구나!!”
힘들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주변을 좀 둘러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기력이 하나 없어 그러지 못했다. 호텔 바로 앞 식당에서 저녁을 면으로 대강 떼우고는 돌아왔다. 숙소는 어제와 비할 수조차 없이 깨끗해 밥을 먹은 이후로 줄곧 꿈나라에 가 있었다.
다음날 아침의 내 모습은 그야말로 ‘초췌’였다. 눈언저리는 지반침하 현상이 생긴 듯했고, 눈은 저녁때의 붉은 해와 닮아있었다. 몸에 힘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또 출발인가하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보니 세찬 여름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얼른 내려가 하루를 더 연장하곤, 이 도시에 구경할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비영탑의 사진이 담긴 팜플렛을 건네받곤 호텔에서 제공하는 아침식사로 아침을 대강 떼우고 그쪽으로 출발했다. 처음보는 중국 소도시의 거리는 너무나 깔끔했다.(중국이니까 소도시지 한국이라면 대도시급이었을 것이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건물들도 많은 반면에 한국에 있더라도 고가일 것 같은 빌라도 상당히 많았다. 말끔히 다듬어진 운하도 멋있긴 했다. 비오는 거리를 한참만에 도착한 비영탑. 두 번 볼 것도 없이 ‘저건 왕지락 도사의 집이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머털도사의 누덕도사의 맞수 왕지락도사말이다.
처음보는 복층 목탑이었다. 그러니까 탑이라는 느낌보다는 집이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었다. 이런 전통식 고층 목탑이 도심을 메운다면, 대단한 볼거리일 것 같았다. 하여튼 놀라움에 가까이 다가섰다. 멀리서 볼 때보다 가까이에서는 대단히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로 보강을 해놓았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해 놓은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한번 올라가볼까도 생각했지만, 흐린 날씨 때문에 이내 단념했다.
<달려라 자전거>는 2006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432일동안 유라시아를 여행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올리는 글은 그 때 당시에 쓴 글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으로 지금의 저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