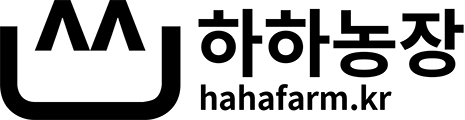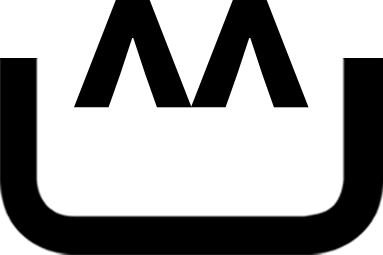내가 돼지를 키울 거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지만, 내가 키우는 돼지가 탈출한다는 생각도 해본 적 없다. 그런데 꿈에서도 볼 일이 없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일상이 되었다. 무려 세 번을 탈출했다. 허술한 임시 비닐하우스 축사라 놀랄 일이 아니긴 하다.
본 축사가 완공되기 전까지 임시로 집 앞 비닐하우스에서 흑돼지 일곱 마리를 먼저 키웠다. 본격적으로 키우기 전에 경험도 필요했고, 씨돼지로 삼는다면 완공 시기와 첫 출산 시기를 엇비슷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침 창고로 소임이 끝난 비닐하우스가 있어 그곳에 키운 것이다.
마법같은 일이 벌어졌다. 나를 보자마자 흩어져 있던 돼지들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닌가.
첫 탈출 때 나는 축사 막바지 공사 중이었다. 그날따라 집 앞 반려견 봄눈이가 유난히 짖었다. 집은 150m 정도 떨어져 있어 정확한 상황 파악이 안 되었다. 어디 고라니가 가까이 내려왔거니 생각했다. 마침 유치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온 아내가 전화로 상황을 전해주었다. “어머! 어떡해! 돼지들이 탈출했어!” 돼지들이 놀라지 않도록 낮게, 하지만 아주 힘있는 목소리였다.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오랜만에 전력질주를 했다.
도착해보니 하우스 안에 두 마리가 보였다. 다른 돼지들이 어디 있나 돌아보았다. 그러자 마법같은 일이 벌어졌다. 나를 보자마자 흩어져 있던 돼지들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닌가. 다섯마리 돼지들이 거짓말같이, 정말 마법같이 나에게 왔다.
순진무구 초롱초롱한 눈망울, ‘아저씨 밥주러 온거야?’하는 표정을 하고 총총총 걸어왔다. 이곳을 자기들의 집으로 생각해 준 게 고마웠다. 사료와 사과 등 동원할 수 있는 먹이들로 유인해 가까스로 임시 축사 안으로 들여보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은 다행히 느낌만으로 끝이 났다. 산으로 뛰어갔다면? 다른 마을에 내려갔다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날 뻔 했다. 돼지들은 비닐하우스 주변에서 호기심을 채우며 놀고 있었다. 탈출이 아니라 외출이었던 셈이다.
탈출의 원인은 나였다. 돼지들은 7평 정도 되는 작은 비닐하우스에서도 밥먹는 자리와 화장실을 나누었는데, 화장실은 계속 높아지고, 밥먹는 자리는 계속 낮아졌다. 곧 이사를 할거라는 생각에 쌓여가는 화장실을 치우지 않고, 낮아지는 ‘밥상’을 채우지 않았던 탓이다.
150m 정도 떨어진 새 축사까지 먹이로 유인해 가면 어떨까 하는 것. 수레에 갇혀서 이동하는 것에 비해 스트레스도 덜 받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좋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첫번째 ‘탈출’은 낮아진 곳에서 일어났고, 이어진 두번째 탈출은 높아진 화장실에서 일어났다.두번째 탈출은 싱겁게 끝났다. 밥주러 나간 나를 반기는 과정에서 한 마리가 얼떨결에 다른 돼지의 등을 타고 철망을 넘은 것이다. 툭하는 소리와 함께 바깥으로 나왔다. 첫번째의 경험 덕분에 당황하지 않았다. 전에 탈출했던 개구멍을 열어주고 안에다 밥을 넣어주는 것만으로 수습되었다.
탈출이 잦아지고 먹이로 유인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알고나니 돼지 이사 아이디어가 번뜩 생각났다. 150m 정도 떨어진 새 축사까지 먹이로 유인해 가면 어떨까 하는 것. 수레에 갇혀서 이동하는 것에 비해 스트레스도 덜 받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좋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던 어느날 개구멍이 또 뚫렸다. 임시로 박아두었던 고춧대를 아예 꺾으며 나왔다. 이번에도 멀리 가지 않고 비닐하우스 주변에서 놀고 있었다. 비교적 크기가 작은 네 마리였다. ‘한 번 데려가봐?’ ‘아니야, 그러다 다른 데 가면 어쩌려고.’ 두 가지 생각이 번개의 속도로 교차했다. 뭔가에 홀린 듯 집에 있는 잔반을 들고 나갔다. 잔반은 돼지들에게 최강의 먹이다.
“야들아, 나온 김에 새 집 가자”하며 내가 먼저 앞장섰다. 태연한 척 하려했지만 맥박이 상당히 올라갔다. 밥을 가지고 왔노라며 나와있는 돼지들 코에 한번씩 갖다대고는 축사 방향으로 슬금슬금 발을 뗐다.

일단 출발은 네 마리가 함께 했다. 시멘트 길에 오르자 한 마리가 갑자기 겁을 먹더니 비닐하우스 쪽으로 뛰어갔다. 남겨진 한 마리의 돌발상황이 걱정되었지만, 이미 길에 올라선 세 마리가 우선이었다. 다행히 세마리는 여전히 나를 따랐다. 크게 한 숨을 쉬고는 떨어지지 않는 발을 겨우 떼어가며 걸었다.
쫄리는 심장을 잡고 겨우 축사 끝에 도착했지만 돼지들은 옆길로 샜다.
안타깝게도 앞으로 나아갈수록 내 양손에 들려있는 잔반에는 관심이 멀어졌다. 길가의 흙과 풀에 쏠려있었다. 넓은 콧구멍을 세웠다 내렸다 특유의 코 움직임으로 탐색을 했다. 왼쪽으로는 가파른 산이어서 오르지 못하지만, 오른쪽은 살짝 내려가기만 하면 닿을 수 있는 우리 밭이 있었다. 밭으로 내려간다면 난감한 상황이었다. 수시로 잔반을 코에 갖다대며 잔반을 들고있다는 걸 인지시켜 주었다.
쫄리는 심장을 잡고 겨우 축사 끝에 도착했지만 돼지들은 옆길로 샜다. 축사 뒷길로 자연스레 가버렸다. 허리를 90도 굽혀 예의를 갖추고, 잔반을 쑥 내밀고 뒷걸음으로 입구쪽으로 걸었다. 평소엔 하찮은 잔반이지만 그 때만큼은 최고급 음식으로 대우했다. 돼지들도 내 마음을 읽었는지 살금살금 따라왔다.


그렇게 문 앞까지 도착했고, 방금까지의 예의는 온데간데없이 문을 열고 ‘옛다’하고 잔반을 던져 넣었다. 두 마리가 허겁지겁 안으로 들어가 쩝쩝거리며 먹기 시작했다. 한눈 팔고 있던 나머지 한 마리는 뒤늦게 알아차리고는 그제야 들어갔다.자신감인지 익숙함인지 나머지 네 마리의 이동도 ‘산책 이사’로 결정했다.
밥을 줄 때마다 나를 인지시키기 위해 “아저씨야~”하는데, 이 날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르겠다. 알아듣는 듯 아닌 듯 따라왔다.
자연양돈 선배들인 <경북자연양돈연구소>와 <고마워돼지>에서 돕기로 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다. 선배 농장들은 이미 ‘탈출’도 많이 겪었고, 이동할 때도 살살 몰아가며 했었다고. ‘축사 밖 돼지’에 당황하지 않는 분들이었다.
설 연휴가 끝난 다음날 돼지를 살피다보니 이전보다 부쩍 배가 불러있었고, 당장이라도 옮기지 않으면 출산을 할 것만 같았다. 바로 전화를 했다. 우리가 자연양돈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선배들 덕분인데, 급한 요청에 흔쾌히 달려와주어 고마움이 한이 없었다.
베테랑들이 모이니 이사는 딱 13분만에 끝이났다. 돼지들로서는 아쉬운 산책이었을 테다. 내가 먹이통을 들고 앞장서고, 그 뒤를 선배들이 큰 합판으로 ㄷ자 대형을 만들며 따라왔다. 낯선 사람들, 환경에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잘 따라와주었다. 밥을 줄 때마다 나를 인지시키기 위해 “아저씨야~”하는데, 이 날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르겠다. 알아듣는 듯 아닌 듯 따라왔다.

새 축사에 도착한 돼지들은 주변에 똥을 몇 번 싸는 것 이외에 별다른 탈 없이 잘 안착했다. 그 전에 와 있던 세 마리 돼지들과도 뜨겁게 인사를 나누었다. 물꼭지를 쓰는 것도 무리없이 바로 해냈다. 깔아놓은 두꺼운 톱밥도 코로 뒤적거리는 것으로 보아 만족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8개월에 가까운 허술한 임시 비닐하우스 축사 생활이 끝났다.
이 글은 한겨레 애니멀피플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