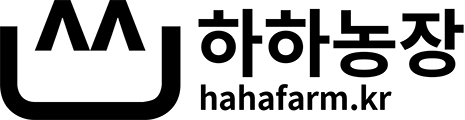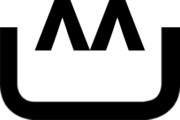풀을 먹인다고 했다. 나는 적잖이 놀랐다. “네? 풀요? 어떤 풀요?” 재차 물었더니 돌아온 답은 더 놀라웠다. “들판에 난 풀은 다 잘먹어요.” 우리 선배농가인 팜핑농장의 이민우씨는 돼지들이 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강조하며 이야기 했다. 소는 풀을 뜯어먹으며 산다고 알고 있었지만, 돼지가 풀을 먹는다는 건 처음듣는 얘기였다. 아니, 돼지가 뭘 먹고 사는지 알게 된 게 처음이었다. 그 이전까지 돼지들이 뭘 먹고 사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작년 집 앞 임시축사에서 돼지 7마리를 키울 때 선배들이 알려준대로 하루 한 수레씩 풀을 베어다 주었다. 아침에 만들어준 발효사료도 잘 먹었지만 오후의 풀도 참 잘먹었다. 던지고 나서 뒤돌아서면 사라졌다. (주의:조금 과장됨) 건강에 좋다고 하니 풀 베는게 귀찮고 힘들어도 보람이 되었다.



어느날 엄마가 전화로 물었다. “너거 돼지들 머 먹고 크노? 엄마 어릴 때는 풀멕이면서 키았다이가.” 나는 다소 크고 흥분된 목소리로 “뭐라고? 풀?”하고 반문했다. 풀은 소수의 ‘자연양돈’ 농가에서만 먹이는 줄 알았다. 엄마 어릴 적에는 집집마다 돼지가 있었고, 그 모두가 풀을 베어다 먹였다고 했다. 그 덕분에 집은 물론 하천 주변에서 풀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엄마는 말을 이었다. “그거 있다이가. 분홍색 꽃 피는거. 그거 참 잘묵었는데. 우리는 돼지풀이라 캤다.” 나는 대번에 ‘고마리’를 떠올렸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역시나 널리 ‘돼지풀’이라고 불렸다. 고마리를 바로 떠올릴 수 있었던 건, 집 주변 도랑에는 고마리가 아주 빽빽하게 자라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엄마, 그거 고마리 아이가?” 했지만 엄마는 “몰라, 그게 고마린지 뭔지 몰라도 돼지풀이라 캤다.” 엄마가 생각하는 돼지풀이 고마리가 아닐 수도 있었지만, ‘우리엄마 어릴 적 돼지풀은 고마리’로 정리하고 주변에 떠벌리고 다녔다.



그런데 의문이 한가지 들었다. 분명, 재작년 우리밭에 왔던 멧돼지들은 풀을 먹지 않았다. ‘내일 옥수수를 따야지’했던 그날 밤, 멧돼지(아마 가족)가 우리 옥수수밭을 덮쳤다. 신기하게도 옥수수대를 쓰러뜨리고선 열매만 먹고, 옥수수대는 건드리지 않았다. 만약 평소 풀을 즐긴다면 굳이 열매만 먹을리가 없었다. 번거롭지 않게 그냥 다 씹어먹으면 될 일이다. 농장 돼지들은 그렇게 먹는다. 옥수수와 옥수수대를 같이 씹어먹는다.
풀을 먹을 줄 안다면 풀로 배를 채우는 것이 여러모로 편할 텐데 산이나 들에서 ‘풀뜯어먹는 돼지’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 그렇다면 농장돼지는 어쩌다 풀을 먹게 되었을까? (나는 연구자가 아니므로 얼렁뚱땅 결론을 내리자면) 첫번째, 돼지에게 뭐라도 먹여야 하니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게 풀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사람이 먹고 남긴 잔반을 주로 먹였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풀을 베어다 준 게 아닐까 싶다. 두번째, 풀을 주다보니 돼지들이 건강해져서. 우리가 먹는 채소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다. 그게 자연산이라고 한다면 설명을 보탤 이유가 없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을 비롯 내장기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







우리같은 작은 농가들이 돼지에게 풀을 먹이는 건, 먹을 게 없어서라기보다 두번째 이유 때문이다. 우리농장에서는 미강을 비롯한 농사 부산물들, 최근에는 유기농 사료를 함께 발효시켜 돼지들에게 준다. 사료에는 돼지에게 필요한 (필요하다고 여기는)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있지만, 돼지들 스스로 부족한 영양소를 찾아서 먹을 수는 없다. 사람들도 어떤 날은 채소가 먹고싶고, 어떤 날은 고기가 먹고싶은 것처럼 돼지들도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외출이라도 시켜주고 ‘먹고 싶은거 먹고 오너라’하거나 산을 통째로 넣어주면 좋으련만 아쉬운대로 풀이라도 베어다 주는 것이다.
올 봄, 축사 가는 길에 아내가 “조심해!”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나를 세웠다. 내 주위로 환삼덩굴 새싹들이 빼곡했던 것이다. 예년같으면 ‘와, 지금 발견해서 정말 다행이다’하고 쏙쏙 뽑아버렸을텐데, 이제는 대 환영이다. 환삼덩굴은 돼지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풀인데다 한 포기만 뽑아도 양이 풍성하다. 가성비가 좋다.
감정을 역전시킨 풀이 또 있다. 칡넝쿨. 칡도 하루가 다르게 빨리 자라는데, 넝쿨 끝을 잡고 쫙쫙 당겨서 뽑으면 아주 상쾌하다. 그동안 환삼덩굴, 칡넝쿨만 보면 징글징글했다. 이제는 “여기도 많고” “여기도 많고” 하면서 많이 자라는 곳을 기록해 둘 지경이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축사에 간다.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풀을 뽑아다 줘” 해놓으면 아이들의 방해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아이들이 한 두포기 가져다 주는 풀에 돼지들이 안달이 날 즈음 우리 내외가 나서서 한수레씩 던져주면 환장하고 달려든다. 축사는 논이었던 자리에 지었다. 덕분에 엄마가 돼지풀이라 했던 고마리가 지천으로 깔렸다. 멀리가지 않고서도 좋아하는 풀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요즘은 내가 정육점을 짓느라 아내 혼자서 돼지들을 돌본다. 축사 옆 쪽을 다 베고, 지금은 뒤쪽을 베서 준다. 낫으로 풀을 베기 시작하면 풀냄새가 풍긴다. 냄새를 맡은 한 두마리가 스타카토로 ‘꿀’, ‘꿀’ 딱딱 끊어서 소리를 낸다. 냄새가 퍼질 수록 반응하는 돼지가 늘어나고 결국 아내가 풀베는 쪽으로 우르르 몰려든다. 그 때부터 마음이 바빠진다. ‘차라리 나와서 실컷 먹고 갔으면’하는 생각이란다.
농장돼지들이 풀을 먹는 이유를 두가지라고 했던가? 한가지 더 추가해야할 것 같다. ‘좋아하는 음식’이어서 풀을 먹는 것이다. 내가 하루빨리 정육점을 짓고, 낫을 들어 아내의 부담을 덜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