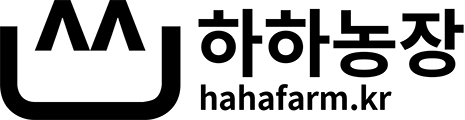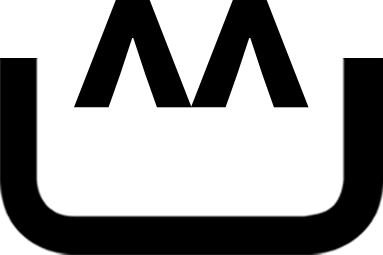엄청난 길이의 내리막길, 그리고 다시 엄청난 길이의 오르막길이 이어졌다. 목적지였던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의 고도가 해발 1700m 정도나 됐기 때문이었다.
자전거를 끌고서 간신이 올랐다.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다. 방이 있으니 자고가라고 했다. 물론 일반가정이 아니라 호텔이었다. 그 때는 이미 기력이 다해 겨우겨우 움직이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그의 말을 들었다. 마을이 바로 지척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리조트’급으로 분류되는 꽤나 고급 숙소에서 묵게된 것이다.
그는 바깥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마침 지나치던 나를 발견하고 호객을 한 것이었다. 다행히 비수기라 저렴한 가격에 묵을 수 있었다.
야외 탁자에서 밥을 먹는데 멀리 하얗게 펼쳐진 것이 처음엔 히말라야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구름이 그 부분에 짙게 깔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쁜 눈과 허름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시 봤을 때 산의 모습이 보였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직원에게 숨넘어가는 목소리와 함께 손으로 가리키며,
“히말라야?”
라고 물어봤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에베레스트도 저 중에 있냐고 물었는데 그것은 뒷산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뒷산에 올라가면 보인다고 일러주었다. 뒷산에 올라갈 여력이 없었으니 그저 그곳에서 보이는 것만 감상했다. 말도안되는 풍경이었다. 조용히 넘어가는 붉은 해에 반사된 황금의 히말라야는 매번 헛숟갈질을 하게끔 만들었다.
히말라야를 넘어왔지만, 둘리켈이라는 곳에서 설산이 길게 늘어선 장면을 처음본 것이다. 둘리켈 역시 아주 높은 곳에 위치했는데, Barabise에서 하룻밤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곳에 올라가지도 못했을 것이다.


카트만두로 향하던 길은 그 때까지 볼 수도 없었고 느낄 수도 없었던 완전 난장판이었다. 차량과 오토바이, 그리고 자전거 릭샤까지 뒤섞여 교통법규의 존재유무가 의심될 정도였다. 카트만두 시내에 들어선 그 정도가 매우 심해 자전거 운전하기가 여간 불안한 것이 아니었다. 목적지는 ‘타멜’이라고 하는 여행자 거리. 네팔에 대한 정보는 전혀가지고 있지 않아 일단 그곳에 가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것도 티베트에서 만난 일본여행자에게서 들은 말 때문이었다.
“캉꼬꾸 이가이노 나까데 이찌방 오이시이 캉꼬꾸 료리야상가 타메루니 아리마스”
(한국 이외의 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한국음식점이 타멜에 있습니다.)
“혼또데스까? 돈나 료리야상 데스까?”(정말요? 어떤음식점인데요?)
“와카리마셍, 에-또 잇떼 미나사이. 소레쟈 와카리마스”(모르겠네요, 가보면 압니다)
교차로가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타멜?’이라고 얘기하며 방향을 잡아나갔다. 그러던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조그마한 택시와 자전거 릭샤, 오토바이가 밀집한 타멜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반가운 얼굴이 스쳤고 바로 소리쳤다.
“제니!!”
통통했던 제니의 얼굴이 바짝 오그라든 것은 둘째치고 얼굴 전체적으로 땟국물이 줄줄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고생도 상당했다는 것이 쉽게 짐작이 갔다. 남자친구 마커스가 안보였다.
“where is 마커스?”(마커스는?)
“he‘s in cafe now. I’m going to there. do you want go there?”
(카페에 있어, 같이갈래?)
“오브콜스~~“
정말 반가웠다. 비슷한 고생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에게서 동질감을 느껴서 그랬을 것이다. 마커스가 있는 곳으로 갔다. 마커스 역시 몰골이 형편없었다. 하얗던 피부는 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검게 그을렸고, 통통했던 볼 역시 주저앉아 있었다.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수고했다고 난리를 쳤다.
그들은 내가 포기했던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도 다녀오고 마지막 고개도 다 자전거로 넘어왔다고 했다. 내게 그 무거운 짐을 달고 그길을 어떻게 넘어왔냐길래 베이스 캠프는 가지 않고 마지막 고개는 트럭을 타고 넘었다고 했더니 너무 잘했단다.(순간 트럭위에서 부들부들 떨며, 컴퓨터를 핑계로 가방들을 바싹 붙들고 있던 기억이 스쳐지나갔다.)
그 말 속에는 그들의 고로가 그대로 묻어있었다. 마커스가 ‘오썸, 오썸’(awesome 멋진, 최고!!) 하면서 그곳을 표현하지만 않았다면 나의 아쉬움은 좀 덜했을 것이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주변을 돌아보니 모두 서양인들에다가 메뉴는 영어에다 간판도 영어로 되어 있었다. 음식도 네팔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크로아상, 바게뜨 빵, 여러 가지 파이와 커피, 카푸치노 등 서양사람들의 입에 맞춘 음식들이었다.
마커스의 친구가 추천해준 숙소를 찾아갔다. 그 길 양쪽으로 즐비한 술집과 음식점, 기념품 상점과 서점까지. 모두 여행자를 위한 것이 아닌게 없었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과 종업원, 가끔씩 보이는 네팔인 행인을 제외하면 그 거리를 누비는 대부분의 사람역시도 여행자들이었다.
신기한 풍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런 곳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짐을 정리하고 길을 가다 발견한 한국음식점에 들렀다. 한국에서 팔아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김치찌개와 반찬들, 특히 김칫국물이 물씬 배인 파김치는 나의 오간장을 다 녹여놓았다.
티베트에서 마주쳤던 자전거 여행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함께했다. 이탈리아 음식점이었는데 그들의 극찬은 끊이질 않았다. 저렴한 가격에 편안한 분위기, 거기에다 친절한 종업원과 맛있는 음식까지!
호주인, 독일인과 스위스인이었기에 그 칭찬이 그럴 듯 했다. 나에게도 맛있는 것은 물론이었다. 나를 제외한 사람들 모두 라싸 – 카트만두 의 단기 자전거 여행자였다. 여행 도중에 서로 잠깐씩 만났던 것이 모두 끈이 되어 모인 것이다.
나도 몇사람 만나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곳을 지나쳤는지 몰랐다. 서로 아는 사람들만 모였는데 8명 정도였으니 모르는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과연 그 구간의 자전거 여행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저녁에는 각종 까페에서 라이브 공연이 진행되었다. 어떤 곳은 락을 연주했고, 어떤 곳은 째즈,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했던 ‘뉴올리언스’라는 까페에서는 그지역 전통악기인 타블라와 전통피리로 연주를 했다.
‘타멜’, 태국의 방콕에 유명한 여행자거리 ‘카오산 로드’가 있다면, 네팔에는 ‘타멜’이 있는 것이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이 여행의 다는 아니지만, 여행자들에게 편안한 휴식처 그 이상이 됨은 물론이고,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한번에 접할 수 있는 것이다.
며칠간에 걸쳐 넋이 나간사람처럼 이곳저곳 누비며 티베트에서 쌓였던 피로를 풀어나갔다. 타멜은 네팔의 색의 잃었다고 아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그곳이 네팔이든 아니든 타멜은 타멜만의 빛을 발했다.
<달려라 자전거>는 2006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432일동안 유라시아를 여행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올리는 글은 그 때 당시에 쓴 글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으로 지금의 저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